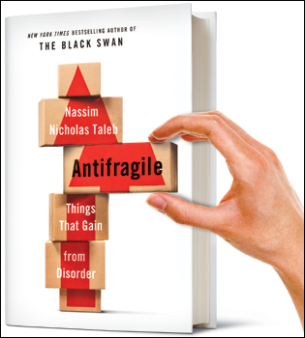넷플릭스에서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는 영화를 찾다가, 토르로 잘 알려진 크리스 헴스워스 주연의 <Extraction> 1,2편을 보게 되었다.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용병이 벌이는 무모한 구출작전이 그 내용인데, 크리스 헴스워스와 한 팀을 이루는 아랍계 여배우의 묘한 매력의 잔상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여배우의 이름은, 골시프테 파라하니. 이란계 배우로써 자국의 여성인권에 대해 비판하다 입국을 금지당하고 지금은 프랑스에 거주하며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배우의 필모그래피를 보다가, 무척이나 구미가 당기는 작품을 발견하곤 곧바로 넷플릭스에서 찾아보았다. 운좋게도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영화였는데, 그 제목은 <패터슨(Paterson)>. 이름부터가 예술가의 풍모를 잔뜩 풍기는 짐 자무쉬 감독의 2016년작으로, 골시프테 파라하니와 함께 아담 드라이버가 주연을 맡았다. 짐 자무쉬에 아담 드라이버라니, 이만하면 우연히 찾아본 영화 치고는 꽤 만족스럽지 않은가? 영화를 보고 난 뒤의 만족감은 발견의 그것을 훨씬 뛰어 넘는 것이었다. 예술작품을 비교한다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지만, 내 관점에서는 아담 드라이버의 또다른 대표작, <결혼이야기> 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줄 만 할 정도로 매우 감동적인 영화라 할만 하다.
재미있는 것은, 이 <패터슨>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즈음, 최근에 본 또 다른 영화, 케이트 블란쳇 주연의 <타르>가 오버랩 되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아마도 패터슨과 타르라는 두 인물의 삶이 완벽히 대척점에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리라. 오늘은 이 두 영화 속 인물에 대한 단상을 적어보려 한다.

#시를 쓰는 어느 소도시의 버스운전사, 패터슨
패터슨은 미국 뉴저지의 작은 도시인 패터슨에서 버스를 운전하며 살아간다. 그는 버스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가지만 그의 정체성은 버스 운전사가 아니라 시인이다. 그는 하루하루 별 다를 것 없는 일상에서도 비범한 시선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시상을 이끌어 낸다. 컵케이크 파티쉐와 컨트리 뮤지션을 꿈꾸는 아내와 매일 같은 침대에서 눈을 뜨고, 아내가 싸 준 도시락을 싸들고 출근한 다음, 버스 운전석에서 잠시 시를 다듬고 나서 동료의 실없는 푸념을 들어준다. 낮에는 온종일 버스를 운전하며 승객들의 이런저런 대화들을 듣곤 하며, 퇴근한 뒤에는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나서 함께 저녁을 먹고, 사랑스러운 불독 마빈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 동네 모퉁이의 어느 바에서 가볍게 술잔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패터슨의 하루 일과이다. 물론 틈 날 때마다 그는 시를 쓰고 다듬는다. 영화는 2시간 가까운 시간동안 패터슨의 일주일을 담아내는데, 하루하루가 같은 듯 하면서도 조금씩 다르고, 다른 듯 하면서도 같다. 패터슨의 일상은 얼핏 단조롭고 물질적으로 빈곤해 보이지만, 기실 모든 순간 모든 하루가 온전하며, 그 모든 것들은 오롯이 패터슨의 것이다.

#넘볼 수 없는 업적을 이룬, 베를린 필하모닉 최초의 여성 지휘자, 타르
타르는 미국 빅5 관현악단의 지휘자를 거쳐, 세계 최고 명성의 베를린 필하모닉 여성 지휘자를 맡고 있다. 음악계에서 여성들을 가로막던 유리천장을 스스로 깨부수고 있으며,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 또한 숨기지 않는다. 후진을 양성하기 위한 재단에도 참여하고 있고, 팬데믹 이후에 말러의 교향곡 5번 공연 실황을 녹음함으로써 역사에 한 획을 그으려 한다. 이렇듯 완벽해 보이는 삶을 구축한 타르는, 그가 가진 권력을 남용하여 젊은 음악인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괴롭혔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하루 아침에 몰락하는 신세가 된다. 투명하리만치 단순한 패터슨의 삶과는 정반대로, 타르의 그것은 겉과 속이 전혀 다르다. 인터뷰에서 ‘나는 비평을 읽지 않는다’고 했으면서 정작 언론에서 자신을 어떻게 다루는지 예민할 정도로 신경 쓰고, 여성음악인들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듯한 리더십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자신의 독보적인 지위를 지키기 위해 잔인하리만치 냉정한 행위를 일삼는다. 자신의 파트너인 샤론과 딸을 아끼는 듯 하다가도, 집을 비우고 멀리 출장을 떠나서는 다른 여성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샤론의 전화는 받지도 않는다. 사상누각, 또는 허상과도 같은 타르의 일상은 온전함과 거리가 멀다.
#정체성의 위기
‘가난하지만 자족하는 삶’과 ‘화려하지만 공허한 삶’의 고루한 대비를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 두 편의 영화, 그리고 패터슨과 타르라는 두 인물을 보면서 ‘내 삶을 얼마나 온전한가?’에 대해 자문해 보게 되었다. 나는 패터슨처럼 오롯이 나라는 ‘단독자(單獨者, der Einzelne)’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타르처럼 사회적 지위, 맥락, 관계가 없이는 아무 것도 아닌 허상인가? 40대가 되면서 친구들과 몇 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명함 속 회사, 직업, 직책, 직급, 하는 일 등, 소위 말하는 계급장 떼고 나면 나에게 무엇이 남을까?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같은 맥락에서,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AI와 자동화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될까요?’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한 바 있다. ‘재화가 풍부해 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걱정해야 할 것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인간이 과연 어디에서 정체성을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산업화 이후, 인간은 자신의 직업에서 정체성을 찾아왔는데, 앞으로는 어디에서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아성찰이 필요하다
헨리 키신저, 에릭 슈미트, 대니얼 허튼로커가 함께 쓴 <AI 이후의 세계>를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한다.
“정보에 맥락이 더해질 때 지식이 된다. 그리고 지식에 소신이 더해지면 지혜가 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소신이 생기려면 홀로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인터넷은 이용자에게 수천, 수만, 수억명의 의견을 쏟아부으며 혼자 있을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홀로 생각할 시간이 줄어들면 용기가 위축된다. 용기는 소신을 기르기 위해 꼭 필요하며, 특히 새로운 길, 그래서 대체로 외로운 길을 걸을 때 중요하다. 인간은 소신과 지혜를 갖출 때만 새로운 지평을 탐색할 수 있다. 디지털 세상에는 지혜가 생길 여유가 없다. 디지털 세상에서 중시되는 덕목은 자아성찰이 아닌 타인의 인정이다. 그래서 디지털 세상은 이성이 의식의 요체라는 계몽주의의 명제를 위협한다.”
#일상의 온전함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패터슨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인정도 바라지 않는다. 그는 오로지 시를 통해 세상과 교감하며, 어린 소녀가 들려준 자작시를 곱씹으며 다른 우주를 만난다.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사상누각을 불안하게 쌓아가던 타르와는 달리, 패터슨에게는 애초부터 무너질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패터슨은 온전히 패터슨이고, 그의 이름이 그가 평생 살아온 고향 도시인 패터슨과 같은 것은 짐작컨대 패터슨의 온전한 삶에 대한 짐 자무쉬 감독의 시적 표현이리라. 그렇다면 내 이름 석 자는 어떠한가. 어디까지가 사상누각이고 어디까지가 오롯이 내 것일까. 얼기설기 엮어온 관계, 커리어, 소비, 소셜미디어 계정, 이런 것들을 모두 걷어내고 나면 내 삶과 일상은 얼마나 추레할까.
#온전한 삶을 위하여
사실 ‘온전하다’는 표현보다는 영어로 ‘Integrity’ 라고 쓰는 편이 더 적확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진실하고, 그 자체로 완전하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인 상태. 한 마디로, 모든 것을 다 까발려도 아무 거리낄 것이 없는 상태. 패터슨은 그런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타르는 까발리면 끝모르게 무너지는 사람이다. 내 일상에 있어 온전한 순간을 억지로라도 찾아보자면, 책을 읽고, 커피를 내리고, 사랑스러운 내 강아지와 산책하는 순간. 고향인 제주 남쪽 바다의 끝없는 수평선에 넋을 놓는 순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순간. 그리고 직업적으로 온전한 경험은, 별다른 수식어를 동원하지 않고 “저는 세탁을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단순명료함을 바탕으로 동료들과 함께 하루하루 성장해 나아가는 것. 이런 온전한 순간들을 걷어내고 나면, 나머지는 모두 훅 불면 날아가버릴, 별 의미없는 시간들의 더미가 아닐까 싶다. 감히 시인의 삶에 닿을 수는 없는 노릇이겠으나,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의 내 삶이 조금은 더 온전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