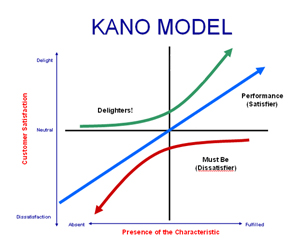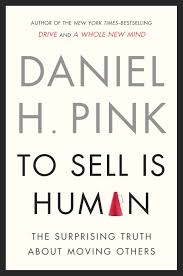당대의 불문학자이자 시대의 ‘어른’ 이라 할만 한 황현산 선생님의 산문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하곤 생각에 잠겨 글을 쓴다.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서울에서 부지불식간에 고개를 돌려야 할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니다. 염상섭이 살던 집과 현진건의 마지막 집필집은 무사한가. 이태준의 수연산방에서는 아직도 차를 팔고 있는가. 문필가들과 마찬가지로 건축가들도 관심을 가졌을 이상의 집터는 지금 누구의 소유일까. 그리고 또, 그리고 또.
바닷가의 갯바위에는 이상한 이끼가 있다. 썰물일 때 뜨거운 햇볕 아래서는 줄기와 뿌리가 죽어 있는 마른풀처럼 보이지만, 밀려온 바닷물에 다시 적시면 순식간에 푸른 풀처럼 살아난다. 지금 서울시는 서울을 디자인하느라고 바쁘다. 그 디자인이 기억의 땅을 백지로 만들고 통속적인 그림을 그려넣는 일이 아니기를 바란다. 마른 기억의 이끼를 싱싱한 풀로 일으켜 세우는 밀물이길 바란다.’ 2010, 황현산, ‘기억과 장소’, <밤이 선생이다> 中
이 글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디자인 서울’ 을 기치로 내걸고 일련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즈음에 쓰여졌다. 세빛둥둥섬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한창 지어지고 있던 바로 그 시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가 추진한 디자인 사업들은 황 선생님의 바램처럼 ‘마른 기억의 이끼를 싱싱한 풀로 일으켜 세우는 밀물’ 이 되지는 못한 듯 싶다 .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박원순 시장이 민선 6기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었고,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에 내 눈에 자주 띄는 것이 바로 ‘서울브랜드‘ 사업인데,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서울시의 브랜드를 정립하고자 하는 시도가 열린 시정의 한 단면을 보는 듯 한데다 기업들의 디지털 마케팅을 돕고 있는 나의 직업과도 무관하지 않은터라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현재 이 사업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며, 시민 투표 등을 통해 서울시의 브랜드 슬로건을 선정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현재 후보작으로 올라와 있는 브랜드 슬로건은 다음 세 가지이다.
- I.SEOUL.YOU – 나와 너의 서울
- 서울은 진행형 – seouling
- SEOULMATE – 나의 친구 서울
세 슬로건 모두 나름의 의미를 담고 있고 디자인 관점에서도 재기발랄한 표현이라 할 만 하다. 그런데 이 슬로건들이 담아내고자 했던 가치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서울의 정체성, 즉 서울다움을 나타내는 세 가지 대표 키워드인 ‘공존, 열정, 여유’ 라고 한다.
나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상경했기 때문에 이제 만 17년째 서울에서 살고 있다. 군 복무, 직장 생활 등을 위해 부산에서 거주했던 6년 간을 제외하고도 10년 이상 서울에 거주한 셈이다. 내 정체성은 변함없는 ‘부산사람’ 이지만, 물리적으로 서울에서 거주한 시간을 감안한다면 서울이라는 도시의 가치에 대해서 경험에 근거한 의견을 피력하기에 충분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여 감히 말하건대, ‘공존, 열정, 여유’ 는 서울다움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공존.
강남구청장은 최근 ‘서울시장님께 드리는 공개질문’을 통해 한전부지 개발 사전 협상에 강남구를 배제하는 이유를 물으면서 “이럴 바에 서울시는 차라리 가칭 ‘강남특별자치구’ 설치를 중앙에 건의해 아예 강남구를 서울시에서 추방시키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에 대해 대답을 요구했다. 뿐인가? 자신의 아이들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아이들과 같은 학교에 보낼 수 없다며 학교 배정을 철회해 달라는 시위가 벌어지는 곳이 서울이라는 도시이다. 서울의 심장인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 도시가 공존의 공간인지, 분열의 공간인지.
열정.
‘헬조선’ 이라는 절망적이고도 자조적인 단어가 작금의 대한민국을 드러내는 키워드일진대, 그 ‘헬조선’의 수도인 서울이 과연 ‘열정’ 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울 수 있을까? 2002년 월드컵 당시 온 도시를 물들였던 붉은 열정의 끄트머리라도 잡고 싶은 것일까? 세대를 막론하고 희망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이 도시에서 ‘열정’ 을 내세우는 건 어디에서 비롯된 자신감일까?
여유.
언어에도 효율성이라는 것이 있다면, ‘여유’ 라는 것이 서울이라는 도시와 어울리지 않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일도 없을 것이다. 각박하기 그지 없는 Busy city, 저녁이 없는 삶, 24시간 편의점, 업무와 관련된 메일의 제목마다 붙어있는 ‘급’ 이라는 Header. 육사 시인이 살아계셨다면 그가 노래했던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는 서릿발 칼날진 그 위’ 가 바로 이 나라의 수도라는 사실에 통탄하시지 않았을까?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나 또한 기업에 있으면서 corporate culture & value 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도 있다. 무릇 도시이든 기업이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는 좋은 모습과 좋지 않은 모습이 공존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모두가 함께 바라는 이상을 추려 오롯이 담아내고 공유함으로써 같은 방향으로 손잡고 나아가는 경험을 구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 또한 현실에 단단히 뿌리를 박았을 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공동체의 구성원조차 동의하지 못하고 자조한다면 그것을 아무리 멋들어진 브랜드 패키지로 포장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외국에서 서울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티셔츠와 머그컵 몇 잔 팔기 위한 디자인에 그치지 않는다면, 이런 지난한 과정이야말로 전시행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corporate culture & value 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던 시절, 국내 30대 기업의 핵심가치와 슬로건을 조사한 적이 있었다. 다양한 배경과 업종의 기업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30대 기업의 핵심가치 중 80% 가 단 4가지의 키워드로 채워져 있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도전’, ‘열정’, ‘신뢰’, ‘전문성’ 같은 단어들이었다. 만약 서울시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들이 브랜드를 정립한다면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 현실을 용기있게 직시하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담아내고자 하는 고통스럽고도 치열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공존, 열정, 여유’ 와 같은 아름다운 키워드들만이 그 자리를 차지한 채 서울시민들의 삶과 유리되고 말 것이다.
황현산 선생님의 글을 작금의 상황에 맞추어 수미쌍관하고 글을 맺는다.
‘지금 서울시는 서울을 브랜딩하느라고 바쁘다. 그 브랜딩이 기억의 땅을 백지로 만들고 통속적인 그림을 그려넣는 일이 아니기를 바란다. 마른 기억의 이끼를 싱싱한 풀로 일으켜 세우는 밀물이길 바란다.’